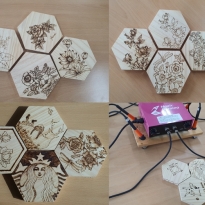우리들의 서재
『이렇게 살아가도 괜찮은가』(피터 싱어 저, 노승영 옮김, 시대의 창, 2014)
독서인구가 해마다 줄어가고 있다는 탄식은 새롭지 않다. 매해 독서관련 통계가 발표될 때마다 반복되는 레퍼토리다. 매번 독서관련 통계는 바닥치 기록을 갱신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2년마다 실시하는 ‘국민독서실태조사’에 따르면 2013년 성인의 연평균 독서량은 9.2권에 불과하다. 2011년의 바닥치보다 0.7권 줄어든 신기록이다. 평균 도서구입비 역시 매해 최저 기록을 갱신한다. 2013년 전국 2인 이상 가계가 책을 사는 데 지출한 평균 비용은 월 1만 8690원이다. 2003년 이 조사가 실시된 이후 최저 수준이다.
독서인구 감소와 관련하여 사회과학 분야는 독서인구의 감소 현상이 현저하게 나타나는 영역일 것이다. 그래서 일까? 도서의 판매량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대형 서점 중에는 아예 사회과학 분야의 베스트셀러를 집계하지 않는 곳도 있다. 온라인 서점은 각 책별로 판매지수를 제시한다. 판매지수 자체가 판매량과 동일하지는 않지만, 판매지수는 해당 도서의 판매량을 추정할 수 있는 자료이다. 사회과학 분야의 책은 베스트셀러라 할지라도 보통 타 분야 베스트셀러의 판매지수와 비교해볼 때 현저하게 낮다. 이것이 2014년의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이다.
어떤 책은 위안을 준다. 따듯함을 제공하는 책도 있다. 우리로 하여금 현실을 잊도록 유도하는 책도 있다. 세상이 혼탁할수록, 세상에 지친 사람들은 이런 책을 찾는다. 실용적인 책도 있다. 토익 점수를 올리는 데 도움을 주는 책,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알려주는 책 말이다. 생존경쟁이 치열할수록 사람들은 이런 책에 끌린다. 반면 사회과학은 위안을 제공할 줄 모른다. 더욱이 사회과학은 실용적이지도 못하다. 사람들이 사회과학 책을 외면하는 이유는 이처럼 충분하게 많다.
사회과학 외면이 현실이라면, 이 현실은 과연 정당할까? 우리가 좋은 삶에 대한 기대를 포기하고 현실에 대한 불만족을 감추어가면서 살아 낸다면 그건 인간의 삶이라 할 수 있을까? 동물권 옹호로 유명한 피터 싱어의 『이렇게 살아가도 괜찮은가』는 우리를 ‘궁극적 질문’으로 초대한다.
『이렇게 살아가도 괜찮은가』는 크게 두 부분으로 이뤄져있다. 이 책의 전편은 우리가 살고 있는 모습에 대한 리얼한 묘사를 담고 있다. 피터 싱어는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꼴’에 “제 잇속만 차리는 사회”라는 압축적이면서도 너무나 정확한 표현을 부여했다. 보통 사회과학 책들은 『이렇게 살아가도 괜찮은가』의 전편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의 ‘꼴’에 대한 세밀한 분석을 제공한다. 불만족을 느낄 수밖에 없는 살고 있는 ‘꼴’에 대한 사회과학적 인식은 우리를 냉소적으로 만든다. ‘꼴’에 대한 인식에만 그칠 경우 발생하는 일종의 부작용이다.
만약 『이렇게 살아가도 괜찮은가』가 전편에서 묘사하고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꼴’에만 집중했다면 이 책은 의도하지 않은 냉소주의로 우리를 몰아가는 사회과학 책의 제한성에서 자유롭지 못했을 것이다. 하지만 피터 싱어는 우리가 살고 있는 ‘꼴’의 냉혹한 묘사에 그치지 않는다. 그는 한 발자국 더 나아가 책의 후반부에서 ‘궁극의 질문’을 우리에게 던진다. 피터 싱어의 다음과 같은 말은 우리가 이 책을 왜 읽어야 하는지에 대한 가장 적극적인 주장이다. “중요한 것은 삶이 살 만한 가치가 있는가 없는가를 수동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살 만한 가치가 있는 삶을 의식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말입니다.”(290p).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불만족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제공하는 세상에 대해 불평을 늘어놓는 것보다는 우리가 살고 싶은 세상 살만 한 가치가 있는 세상을 꿈꾸는 일이 더 보람차다. 당연히 그러한 세상을 꿈꾸는 일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대한 냉정한 진단에서 출발해야 하지만, 냉정한 진단에만 머문다면 지식은 우리를 냉소적으로 만든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대한 냉정한 진단이 우리를 냉소적으로 만들지 않고 오히려 보다 나은 미래에 대한 기대로 초대하는 가능성을 『이렇게 살아가도 괜찮은가』는 보여준다. 이런 점에서 『이렇게 살아가도 괜찮은가』는 미래의 사회과학에 대한 하나의 모델이기도 하다.
피터 싱어는 『이렇게 살아가도 괜찮은가』의 후반부에서 던지는 질문을 윤리적 질문이라 했다. 하지만 책의 말미에서 피터 싱어가 적고 있는 다음과 같은 구절을 한번 읽어보자. “너무 늦기 전에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바꾸는 일에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목표를 재고하고 자신의 행동에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지금의 삶이 공평한 가치 기준에 어긋난다면 바꿀 수 있습니다.”(348p) 싱어는 이러한 태도를 윤리적인 태도라 불렀지만, 이 태도는 사실 미래의 사회과학적 태도라 불러야 한다. 대체 어떻게 살아야 제대로 사는 것인지, 자세한 방법을 여기서 다 옮겨 적을 수는 없다. 만약 싱어의 제안들을 그대로 옮긴다면, 스포일러로 가득 찬 영화평과 다를 바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책의 마지막 구절은 최소하나 옮겨 적고 싶다. 그는 이렇게 썼다. “윤리적 삶을 산다는 것은 이 세상의 온갖 고통에 연민을 느껴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바꾸고자 애쓴 위대한 전통에 참여하는 것이니까요.”(348-349p) 이 전통에 참여하고 싶으시다면, 『이렇게 살아가도 괜찮은가』를 펼치면 된다. 이 책은 이 위대한 전통으로의 초대장이다.
글_노명우(아주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이렇게 살아가도 괜찮은가』(피터 싱어 저, 노승영 옮김, 시대의 창, 2014)
<목차>
옮긴이의 글
머리말
01 궁극적 선택
02 제 잇속만 차리는 사회
03 흥청망청의 끝
04 어쩌다 이렇게 살게 되었을까
05 이기적 유전자
06 일본인이 사는 법
07 죄수의 딜레마 벗어나기
08 윤리적 삶
09 윤리의 본질
10 목적을 추구하는 삶
11 좋은 삶
주
찾아보기(문헌)
찾아보기(인명·용어)